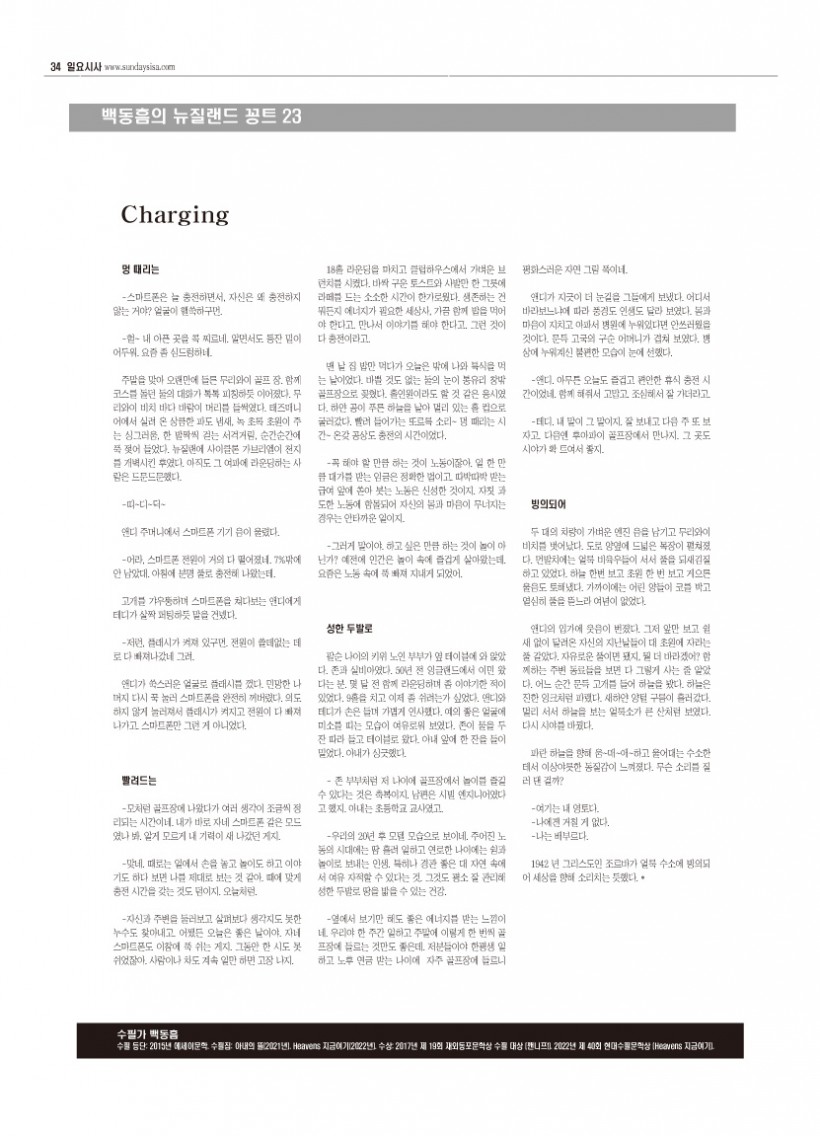백동흠의 뉴질랜드 꽁트 23 ; Charging
멍 때리는
-스마트폰은 늘 충전하면서, 자신은 왜 충전하지 않는 거야? 얼굴이 핼쑥하구먼.
-헐~ 내 아픈 곳을 콕 찌르네. 알면서도 등잔 밑이 어두워. 요즘 좀 심드렁하네.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들른 무리와이 골프 장. 함께 코스를 돌던 둘의 대화가 톡톡 피칭하듯 이어졌다. 무리와이 비치 바다 바람이 머리를 들썩였다. 태즈매니어에서 실려 온 상큼한 파도 냄새, 녹 초록 초원이 주는 싱그러움, 한 발짝씩 걷는 서걱거림, 순간순간에 푹 젖어 들었다. 뉴질랜에 사이클론 가브리엘이 천지를 개벽시킨 후였다. 아직도 그 여파에 라운딩하는 사람은 드문드문했다.
-띠~디~딕~
앤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기기 음이 울렸다.
-어라, 스마트폰 전원이 거의 다 떨어졌네. 7%밖에 안 남았대. 아침에 분명 풀로 충전해 나왔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앤디에게 테디가 살짝 퍼팅하듯 말을 건넸다.
-저런, 플래시가 켜져 있구먼. 전원이 쓸데없는 데로 다 빠져나갔네 그려.
앤디가 쑥스러운 얼굴로 플래시를 껐다. 민망한 나머지 다시 꾹 눌러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버렸다. 의도하지 않게 눌러져서 플래시가 켜지고 전원이 다 빠져나가고.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었다.
빨려드는
-모처럼 골프장에 나왔다가 여러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는 시간이네. 내가 바로 자네 스마트폰 같은 모드였나 봐. 알게 모르게 내 기력이 새 나갔던 게지.
-맞네. 때로는 일에서 손을 놓고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하다 보면 나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아. 때에 맞게 충전 시간을 갖는 것도 덤이지. 오늘처럼.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고 살펴보다 생각지도 못한 누수도 찾아내고. 어쨌든 오늘은 좋은 날이야. 자네 스마트폰도 이참에 푹 쉬는 게지. 그동안 한 시도 못 쉬었잖아. 사람이나 차도 계속 일만 하면 고장 나지.
18홀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가벼운 브런치를 시켰다. 바싹 구운 토스트와 사발만 한 그릇에 라떼를 드는 소소한 시간이 한가로웠다. 생존하는 건 뭐든지 에너지가 필요한 세상사, 가끔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그런 것이 다 충전이라고.
맨 날 집 밥만 먹다가 오늘은 밖에 나와 특식을 먹는 날이었다. 바쁠 것도 없는 둘의 눈이 통유리 창밖 골프장으로 꽂혔다. 홀인원이라도 할 것 같은 응시였다. 하얀 공이 푸른 하늘을 날아 멀리 있는 홀 컵으로 굴러갔다. 빨려 들어가는 또르륵 소리~ 멍 때리는 시간~ 온갖 공상도 충전의 시간이었다.
-꼭 해야 할 만큼 하는 것이 노동이잖아. 일 한 만큼 대가를 받는 임금은 정확한 법이고. 따박따박 받는 급여 앞에 쏟아 붓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지. 자칫 과도한 노동에 함몰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는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놀이 아닌가? 예전에 인간은 놀이 속에 즐겁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노동 속에 푹 빠져 지내게 되었어.
성한 두발로
팔순 나이의 키위 노인 부부가 옆 테이블에 와 앉았다. 존과 실비아였다. 50년 전 잉글랜드에서 이민 왔다는 분. 몇 달 전 함께 라운딩하며 좀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9홀을 치고 이제 좀 쉬려는가 싶었다. 앤디와 테디가 손은 들며 가볍게 인사했다. 예의 좋은 얼굴에 미소를 띠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다. 존이 물을 두 잔 따라 들고 테이블로 왔다. 아내 앞에 한 잔을 들이밀었다. 아내가 싱긋했다.
- 존 부부처럼 저 나이에 골프장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 남편은 시빌 엔지니어였다 고 했지.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우리의 20년 후 모델 모습으로 보이네. 주어진 노동의 시대에는 땀 흘려 일하고 연로한 나이에는 쉼과 놀이로 보내는 인생. 특히나 경관 좋은 대 자연 속에서 여유 자적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평소 잘 관리해 성한 두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건강.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좋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네. 우리야 한 주간 일하고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골프장에 들르는 것만도 좋은데. 저분들이야 한평생 일하고 노후 연금 받는 나이에 자주 골프장에 들르니 평화스러운 자연 그림 폭이네.
앤디가 지긋이 더 눈길을 그들에게 보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풍경도 인생도 달라 보였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면 안쓰러웠을 것이다. 문득 고국의 구순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 병상에 누워계신 불편한 모습이 눈에 선했다.
-앤디. 아무튼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휴식 충전 시간이었네. 함께 해줘서 고맙고. 조심해서 잘 가더라고.
-테디. 내 말이 그 말이지. 잘 보내고 다음 주 또 보자고. 다음엔 후아파이 골프장에서 만나지. 그 곳도 시야가 확 트여서 좋지.
빙의되어
두 대의 차량이 가벼운 엔진 음을 남기고 무리와이 비치를 벗어났다. 도로 양옆에 드넓은 목장이 펼쳐졌다. 먼발치에는 얼룩 비육우들이 서서 풀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하늘 한번 보고 초원 한 번 보고 게으른 울음도 토해냈다. 가까이에는 어린 양들이 코를 박고 열심히 풀을 뜯느라 여념이 없었다.
앤디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저 앞만 보고 쉴 새 없이 달려온 자신의 지난날들이 대 초원에 자라는 풀 같았다. 자유로운 풀이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 함께하는 주변 동료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어느 순간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하늘은 진한 잉크처럼 파랬다. 새하얀 양털 구름이 흘러갔다. 멀리 서서 하늘을 보는 얼룩소가 큰 산처럼 보였다. 다시 시야를 바꿨다.
파란 하늘을 향해 움~매~애~하고 울어대는 수소한테서 이상야릇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무슨 소리를 질러 댄 걸까?
-여기는 내 영토다.
-나에겐 거칠 게 없다.
-나는 배부르다.
1942 년 그리스도인 조르바가 얼룩 수소에 빙의되어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듯했다. *
작가 백동흠
수필 등단: 2015년 에세이문학. 소설등단: 2015년 문학의 봄
수필집: 아내의 뜰(2021년). Heavens 지금여기(2022년).
수상: 2017년 제 19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대상 (깬니프!).
2022년 제 40회 현대수필문학상 (Heavens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