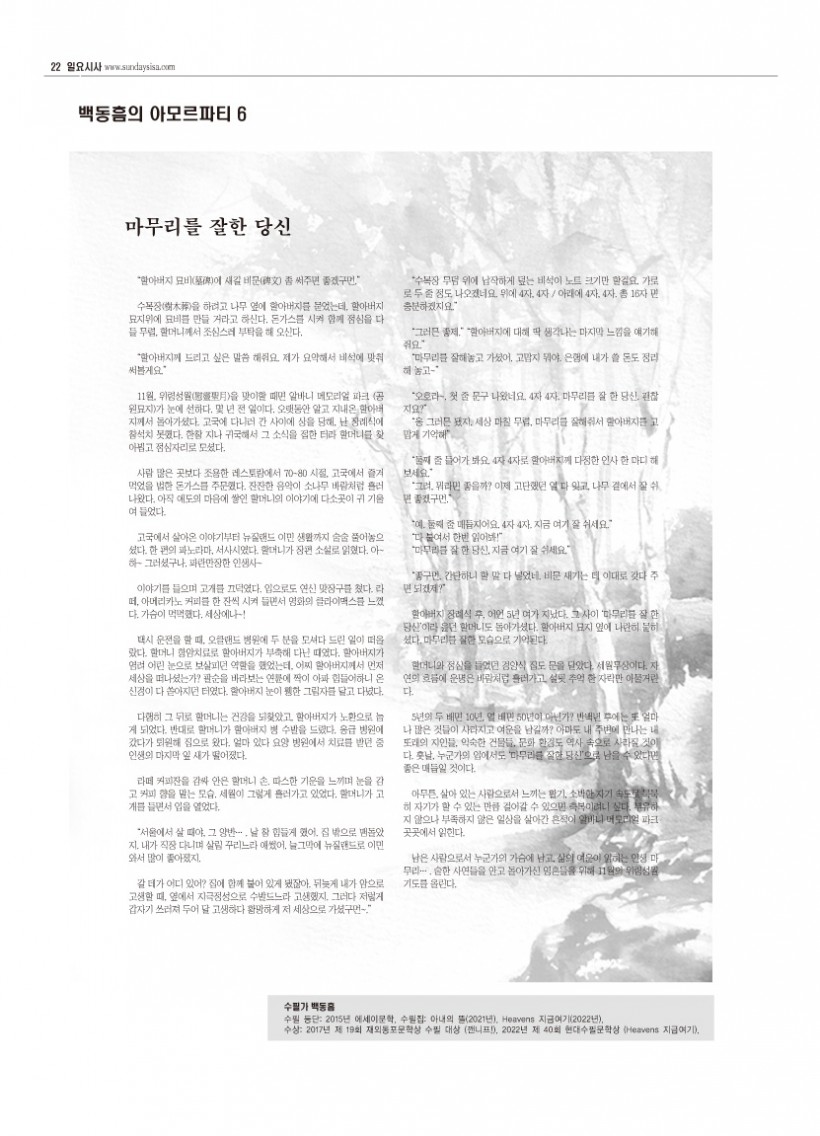백동흠의 아모르파티 6 ; 마무리를 잘한 당신
“할아버지 묘비(墓碑)에 새길 비문(碑文) 좀 써주면 좋겠구먼.”
수목장(樹木葬)을 하려고 나무 옆에 할아버지를 묻었는데, 할아버지 묘지위에 묘비를 만들 거라고 하신다. 돈가스를 시켜 함께 점심을 다 들 무렵, 할머니께서 조심스레 부탁을 해 오신다.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해줘요. 제가 요약해서 비석에 맞춰 써볼게요.”
11월, 위령성월(慰靈聖月)을 맞이할 때면 알바니 메모리얼 파크 (공원묘지)가 눈에 선하다. 몇 년 전 일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고국에 다니러 간 사이에 상을 당해, 난 장례식에 참석치 못했다. 한참 지나 귀국해서 그 소식을 접한 터라 할머니를 찾아뵙고 점심자리로 모셨다.
사람 많은 곳보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70~80 시절, 고국에서 즐겨 먹었을 법한 돈가스를 주문했다. 잔잔한 음악이 소나무 바람처럼 흘러나왔다. 아직 애도의 마음에 쌓인 할머니의 이야기에 다소곳이 귀 기울여 들었다.
고국에서 살아온 이야기부터 뉴질랜드 이민 생활까지 술술 풀어놓으셨다. 한 편의 파노라마, 서사시였다. 할머니가 장편 소설로 읽혔다. 아~하~ 그러셨구나. 파란만장한 인생사~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으로도 연신 맞장구를 쳤다. 라떼,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씩 시켜 들면서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느꼈다. 가슴이 먹먹했다. 세상에나~!
택시 운전을 할 때, 오클랜드 병원에 두 분을 모셔다 드린 일이 떠올랐다. 할머니 항암치료로 할아버지가 부축해 다닌 때였다. 할아버지가 염려 어린 눈으로 보살피던 역할을 했었는데, 어찌 할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가? 팔순을 바라보는 연륜에 짝이 아파 힘들어하니 온 신경이 다 쏟아지던 터였다. 할아버지 눈이 휑한 그림자를 달고 다녔다.
다행히 그 뒤로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눕게 되었다. 반대로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 수발을 드렸다. 응급 병원에 갔다가 퇴원해 집으로 왔다. 얼마 있다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인생의 마지막 잎 새가 떨어졌다.
라떼 커피잔을 감싸 안은 할머니 손. 따스한 기운을 느끼며 눈을 감고 커피 향을 맡는 모습.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면서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살 때야, 그 양반… . 날 참 힘들게 했어. 집 밖으로 맴돌았지. 내가 직장 다니며 살림 꾸리느라 애썼어. 늘그막에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많이 좋아졌지.
갈 데가 어디 있어? 집에 함께 붙어 있게 됐잖아. 뒤늦게 내가 암으로 고생할 때,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수발드느라 고생했지. 그러다 저렇게 갑자기 쓰러져 두어 달 고생하다 황망하게 저 세상으로 가셨구먼~.”
“수목장 무덤 위에 납작하게 덮는 비석이 노트 크기만 할걸요. 가로로 두 줄 정도 나오겠네요. 위에 4자, 4자 / 아래에 4자, 4자. 총 16자 면 충분하겠지요.”
“그러믄 좋제.” “할아버지에 대해 딱 생각나는 마지막 느낌을 얘기해줘요.”
“마무리를 잘해놓고 가셨어. 고맙지 뭐야. 은행에 내가 쓸 돈도 정리해 놓고~”
“오호라~. 첫 줄 문구 나왔네요. 4자 4자. 마무리를 잘 한 당신. 괜찮지요?”
“응 그러믄 됐지. 세상 마칠 무렵, 마무리를 잘해줘서 할아버지를 고맙게 기억해”
“둘째 줄 들어가 봐요. 4자 4자로 할아버지께 다정한 인사 한 마디 해보세요.”
“그려, 뭐라면 좋을까? 이제 고단했던 일 다 잊고, 나무 곁에서 잘 쉬면 좋겠구먼.”
“예. 둘째 줄 매듭지어요. 4자 4자. 지금 여기 잘 쉬세요.”
“다 붙여서 한번 읽어봐!”
“마무리를 잘 한 당신, 지금 여기 잘 쉬세요.”
“좋구먼. 간단하니 할 말 다 넣었네. 비문 새기는 데 이대로 갖다 주면 되겠제?”
할아버지 장례식 후, 어언 5년 여가 지났다. 그 사이 ‘마무리를 잘 한 당신’이라 읊던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묘지 옆에 나란히 묻히셨다. 마무리를 잘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할머니와 점심을 들었던 경양식 집도 문을 닫았다. 세월무상이다. 자연의 흐름에 운명은 바람처럼 흘러가고, 설핏 추억 한 자락만 아물거린다.
5년의 두 배면 10년, 열 배면 50년이 아닌가? 반백년 후에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여운을 남길까? 아마도 내 주변에 만나는 내 또래의 지인들, 익숙한 건물들, 문화 환경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훗날, 누군가의 입에서도 ‘마무리를 잘한 당신’으로 남을 수 있다면 좋은 매듭일 것이다.
아무튼,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활기, 소박한 자기 속도로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걸어갈 수 있으면 축복이려니 싶다. 부유하지 않으나 부족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간 흔적이 알바니 메모리얼 파크 곳곳에서 읽힌다.
남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가슴에 남고, 삶의 여운이 읽히는 인생 마무리… . 숱한 사연들을 안고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11월의 위령성월 기도를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