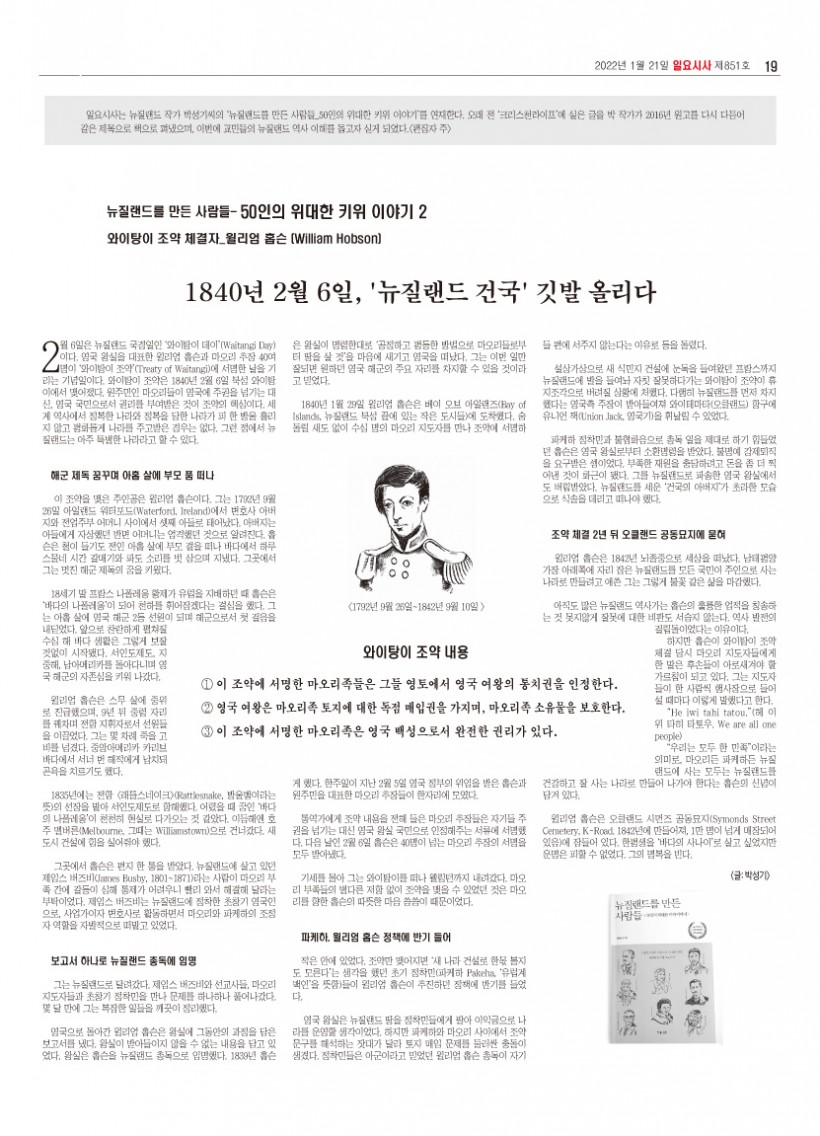뉴질랜드를 만든 사람들- 50인의 위대한 키위 이야기 2
와이탕이 조약 체결자_윌리엄 홉슨 (William Hobson)
1840년 2월 6일, '뉴질랜드 건국' 깃발 올리다
와이탕이 조약 내용
① 이 조약에 서명한 마오리족들은 그들 영토에서 영국 여왕의 통치권을 인정한다.
② 영국 여왕은 마오리족 토지에 대한 독점 매입권을 가지며, 마오리족 소유물을 보호한다.
③ 이 조약에 서명한 마오리족은 영국 백성으로서 완전한 권리가 있다.
2월 6일은 뉴질랜드 국경일인 ‘와이탕이 데이’(Waitangi Day)이다. 영국 왕실을 대표한 윌리엄 홉슨과 마오리 추장 40여 명이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에 서명한 날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와이탕이 조약은 1840년 2월 6일 북섬 와이탕이에서 맺어졌다. 원주민인 마오리들이 영국에 주권을 넘기는 대신, 영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조약의 핵심이다. 세계 역사에서 정복한 나라와 정복을 당한 나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나라를 주고받은 경우는 없다. 그런 점에서 뉴질랜드는 아주 특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해군 제독 꿈꾸며 아홉 살에 부모 품 떠나
이 조약을 맺은 주인공은 윌리엄 홉슨이다. 그는 1792년 9월 26일 아일랜드 워터포드(Waterford, Ireland)에서 변호사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상했던 반면 어머니는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홉슨은 철이 들기도 전인 아홉 살에 부모 곁을 떠나 바다에서 하루 스물네 시간 갈매기와 파도 소리를 벗 삼으며 지냈다. 그곳에서 그는 멋진 해군 제독의 꿈을 키웠다.
18세기 말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을 지배하던 때 홉슨은 ‘바다의 나폴레옹’이 되어 천하를 휘어잡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아홉 살에 영국 해군 2등 선원이 되며 해군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찬란하게 펼쳐질 수십 해 바다 생활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시작됐다. 서인도제도, 지중해, 남아메리카를 돌아다니며 영국 해군의 자존심을 키워 나갔다.
윌리엄 홉슨은 스무 살에 중위로 진급했으며, 9년 뒤 중령 자리를 꿰차며 전함 지휘자로서 선원들을 이끌었다. 그는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바다에서 서너 번 해적에게 납치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1835년에는 전함 <래틀스네이크>(Rattlesnake, 방울뱀이라는 뜻)의 선장을 맡아 서인도제도로 항해했다. 어렸을 때 꿈인 ‘바다의 나폴레옹’이 천천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이듬해엔 호주 멜버른(Melbourne, 그때는 Williamstown)으로 건너갔다. 새 도시 건설에 힘을 실어줘야 했다.
그곳에서 홉슨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던 제임스 버즈비(James Busby, 1801~1871)라는 사람이 마오리 부족 간에 갈등이 심해 통제가 어려우니 빨리 와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제임스 버즈비는 뉴질랜드에 정착한 초창기 영국인으로, 사업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마오리와 파케하의 조정자 역할을 자발적으로 떠맡고 있었다.
보고서 하나로 뉴질랜드 총독에 임명
그는 뉴질랜드로 달려갔다. 제임스 버즈비와 선교사들, 마오리 지도자들과 초창기 정착민을 만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몇 달 만에 그는 복잡한 일들을 깨끗이 정리했다.
영국으로 돌아간 윌리엄 홉슨은 왕실에 그동안의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왕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왕실은 홉슨을 뉴질랜드 총독으로 임명했다. 1839년 홉슨은 왕실이 명령한대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마오리들로부터 땅을 살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영국을 떠났다. 그는 이번 일만 잘되면 원하던 영국 해군의 주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1840년 1월 29일 윌리엄 홉슨은 베이 오브 아일랜즈(Bay of Islands, 뉴질랜드 북섬 끝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 도착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수십 명의 마오리 지도자를 만나 조약에 서명하게 했다. 한주일이 지난 2월 5일 영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홉슨과 원주민을 대표한 마오리 추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통역가에게 조약 내용을 전해 들은 마오리 추장들은 자기들 주권을 넘기는 대신 영국 왕실 국민으로 인정해주는 서류에 서명했다. 다음 날인 2월 6일 홉슨은 40명이 넘는 마오리 추장의 서명을 모두 받아냈다.
기세를 몰아 그는 와이탕이를 떠나 웰링턴까지 내려갔다. 마오리 부족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마오리를 향한 홉슨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었다.
파케하, 윌리엄 홉슨 정책에 반기 들어
적은 안에 있었다. 조약만 맺어지면 ‘새 나라 건설로 한몫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초기 정착민(파케하 Pakeha, ‘유럽계 백인’을 뜻함)들이 윌리엄 홉슨이 추진하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영국 왕실은 뉴질랜드 땅을 정착민들에게 팔아 이익금으로 나라를 운영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파케하와 마오리 사이에서 조약 문구를 해석하는 잣대가 달라 토지 매입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생겼다. 정착민들은 아군이라고 믿었던 윌리엄 홉슨 총독이 자기들 편에 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을 돌렸다.
설상가상으로 새 식민지 건설에 눈독을 들여왔던 프랑스까지 뉴질랜드에 발을 들여놔 자칫 잘못하다가는 와이탕이 조약이 휴지조각으로 버려질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뉴질랜드를 먼저 차지했다는 영국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와이테마타(오클랜드) 항구에 유니언 잭(Union Jack, 영국기)을 휘날릴 수 있었다.
파케하 정착민과 불협화음으로 총독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홉슨은 영국 왕실로부터 소환명령을 받았다. 불명예 강제퇴직을 요구받은 셈이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돈을 좀 더 찍어낸 것이 화근이 됐다. 그를 뉴질랜드로 파송한 영국 왕실에서도 버림받았다. 뉴질랜드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식솔을 데리고 떠나야 했다.
조약 체결 2년 뒤 오클랜드 공동묘지에 묻혀
윌리엄 홉슨은 1842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태평양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은 뉴질랜드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애쓴 그는 그렇게 불꽃 같은 삶을 마감했다.
아직도 많은 뉴질랜드 역사가는 홉슨의 훌륭한 업적을 칭송하는 것 못지않게 잘못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홉슨이 와이탕이 조약 체결 당시 마오리 지도자들에게 한 말은 후손들이 아로새겨야 할 가르침이 되고 있다. 그는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행사장으로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He iwi tahi tatou.”(헤 이위 타히 타토우. We are all one people)
“우리는 모두 한 민족”이라는 의미로, 마오리든 파케하든 뉴질랜드에 사는 모두는 뉴질랜드를 건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홉슨의 신념이 담겨 있다.
윌리엄 홉슨은 오클랜드 시먼즈 공동묘지(Symonds Street Cemetery, K-Road. 1842년에 만들어져, 1만 명이 넘게 매장되어 있음)에 잠들어 있다. 한평생을 ‘바다의 사나이’로 살고 싶었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