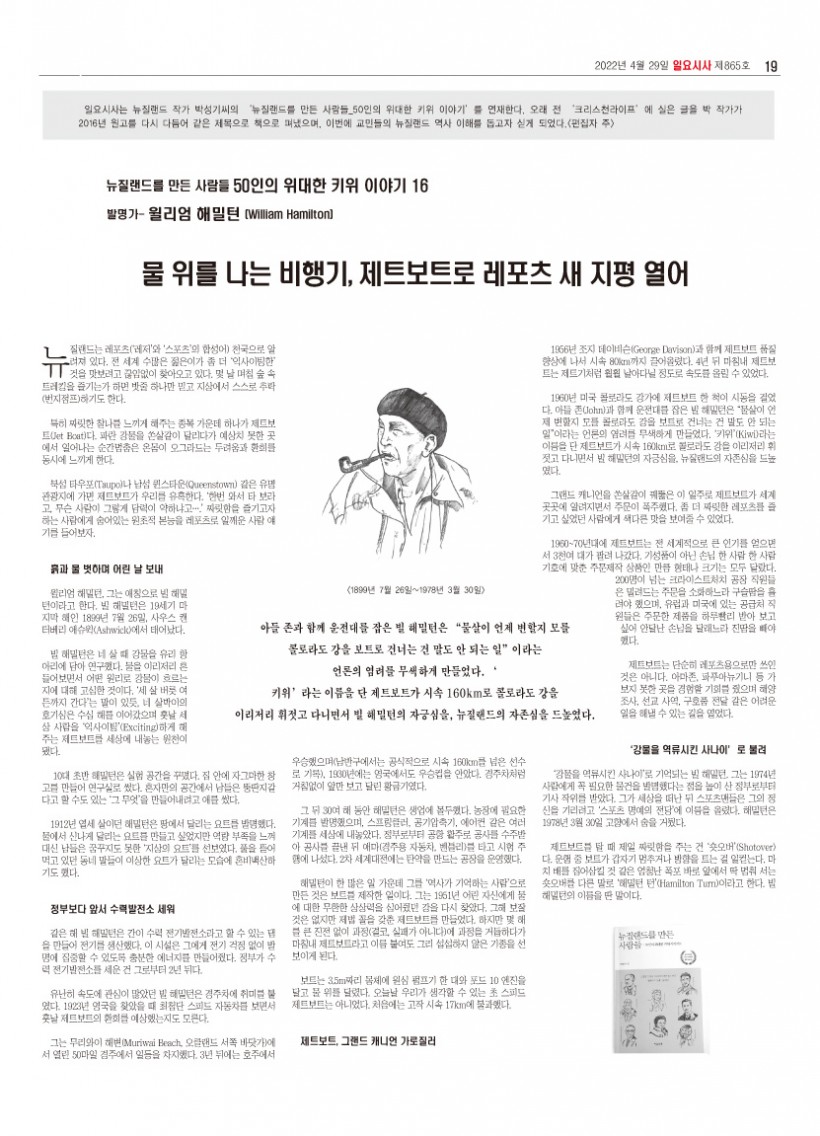뉴질랜드를 만든 사람들 50인의 위대한 키위 이야기 16 ; 발명가- 윌리엄 해밀턴 (William Hamilton)
<1899년 7월 26일~1978년 3월 30일>
물 위를 나는 비행기, 제트보트로 레포츠 새 지평 열어
아들 존과 함께 운전대를 잡은 빌 해밀턴은 “물살이 언제 변할지 모를
콜로라도 강을 보트로 건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언론의 염려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
키위’라는 이름을 단 제트보트가 시속 160km로 콜로라도 강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빌 해밀턴의 자긍심을, 뉴질랜드의 자존심을 드높였다.
뉴질랜드는 레포츠(‘레저’와 ‘스포츠’의 합성어)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가 좀 더 ‘익사이팅한’ 것을 맛보려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몇 날 며칠 숲 속 트레킹을 즐기는가 하면 밧줄 하나만 믿고 지상에서 스스로 추락(번지점프)하기도 한다.
특히 짜릿한 찰나를 느끼게 해주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제트보트(Jet Boat)다. 파란 강물을 쏜살같이 달리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순간멈춤은 온몸이 오그라드는 두려움과 환희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북섬 타우포(Taupo)나 남섬 퀸스타운(Queenstown) 같은 유명 관광지에 가면 제트보트가 우리를 유혹한다. ‘한번 와서 타 보라고, 무슨 사람이 그렇게 담력이 약하냐고….’ 짜릿함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숨어있는 원초적 본능을 레포츠로 일깨운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
흙과 물 벗하며 어린 날 보내
윌리엄 해밀턴, 그는 애칭으로 빌 해밀턴이라고 한다. 빌 해밀턴은 19세기 마지막 해인 1899년 7월 26일, 사우스 캔터베리 애슈윅(Ashwick)에서 태어났다.
빌 해밀턴은 네 살 때 강물을 유리 항아리에 담아 연구했다. 물을 이리저리 흔들어보면서 어떤 원리로 강물이 흐르는지에 대해 고심한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네 살박이의 호기심은 수십 해를 이어갔으며 훗날 세상 사람을 ‘익사이팅’(Exciting)하게 해주는 제트보트를 세상에 내놓는 원천이 됐다.
10대 초반 해밀턴은 실험 공간을 꾸몄다. 집 안에 자그마한 창고를 만들어 연구실로 썼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남들은 뚱딴지같다고 할 수도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다.
1912년 열세 살이던 해밀턴은 땅에서 달리는 요트를 발명했다. 물에서 신나게 달리는 요트를 만들고 싶었지만 역량 부족을 느껴 대신 남들은 꿈꾸지도 못한 ‘지상의 요트’를 선보였다. 풀을 뜯어먹고 있던 동네 말들이 이상한 요트가 달리는 모습에 혼비백산하기도 했다.
정부보다 앞서 수력발전소 세워
같은 해 빌 해밀턴은 간이 수력 전기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했다. 이 시설은 그에게 전기 걱정 없이 발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줬다. 정부가 수력 전기발전소를 세운 건 그로부터 2년 뒤다.
유난히 속도에 관심이 많았던 빌 해밀턴은 경주차에 취미를 붙였다. 1923년 영국을 찾았을 때 최첨단 스피드 자동차를 보면서 훗날 제트보트의 환희를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무리와이 해변(Muriwai Beach, 오클랜드 서쪽 바닷가)에서 열린 50마일 경주에서 일등을 차지했다. 3년 뒤에는 호주에서 우승했으며(남반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속 160km를 넘은 선수로 기록), 1930년에는 영국에서도 우승컵을 안았다. 경주차처럼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린 황금기였다.
그 뒤 30여 해 동안 해밀턴은 생업에 몰두했다. 농장에 필요한 기계를 발명했으며, 스프링클러, 공기압축기, 에어컨 같은 여러 기계를 세상에 내놓았다. 정부로부터 공항 활주로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끝낸 뒤 애마(경주용 자동차, 벤틀리)를 타고 시험 주행에 나섰다. 2차 세계대전에는 탄약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다.
해밀턴이 한 많은 일 가운데 그를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보트를 제작한 일이다. 그는 1951년 어린 자신에게 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줬던 강을 다시 찾았다. 그해 보잘 것은 없지만 제법 꼴을 갖춘 제트보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몇 해를 큰 진전 없이 과정(결코, 실패가 아니다)에 과정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제트보트라고 이름 붙여도 그리 섭섭하지 않은 기종을 선보이게 된다.
보트는 3.5m짜리 몸체에 원심 펌프기 한 대와 포드 10 엔진을 달고 물 위를 달렸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초 스피드 제트보트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고작 시속 17km에 불과했다.
제트보트, 그랜드 캐니언 가로질러
1956년 조지 데이비슨(George Davison)과 함께 제트보트 품질 향상에 나서 시속 80km까지 끌어올렸다. 4년 뒤 마침내 제트보트는 제트기처럼 훨훨 날아다닐 정도로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
1960년 미국 콜로라도 강가에 제트보트 한 척이 시동을 걸었다. 아들 존(John)과 함께 운전대를 잡은 빌 해밀턴은 “물살이 언제 변할지 모를 콜로라도 강을 보트로 건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언론의 염려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키위’(Kiwi)라는 이름을 단 제트보트가 시속 160km로 콜로라도 강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빌 해밀턴의 자긍심을, 뉴질랜드의 자존심을 드높였다.
그랜드 캐니언을 쏜살같이 꿰뚫은 이 일주로 제트보트가 세계 곳곳에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주했다. 좀 더 짜릿한 레포츠를 즐기고 싶었던 사람에게 색다른 맛을 보여줄 수 있었다.
1960~70년대에 제트보트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3천여 대가 팔려 나갔다. 기성품이 아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기호에 맞춘 주문제작 상품인 만큼 형태나 크기는 모두 달랐다. 200명이 넘는 크라이스트처치 공장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구슬땀을 흘려야 했으며, 유럽과 미국에 있는 공급처 직원들은 주문한 제품을 하루빨리 받아 보고 싶어 안달난 손님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제트보트는 단순히 레포츠용으로만 쓰인 것은 아니다. 아마존, 파푸아뉴기니 등 가보지 못한 곳을 경험할 기회를 줬으며 해양 조사, 선교 사역, 구호품 전달 같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강물을 역류시킨 사나이’로 불려
‘강물을 역류시킨 사나이’로 기억되는 빌 해밀턴. 그는 1974년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발명했다는 점을 높이 산 정부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스포츠맨들은 그의 정신을 기리려고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해밀턴은 1978년 3월 30일 고향에서 숨을 거뒀다.
제트보트를 탈 때 제일 짜릿함을 주는 건 ‘숏오버’(Shotover)다. 운행 중 보트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트는 걸 일컫는다. 마치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폭포 바로 앞에서 딱 멈춰 서는 숏오버를 다른 말로 ‘해밀턴 턴’(Hamilton Turn)이라고 한다. 빌 해밀턴의 이름을 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