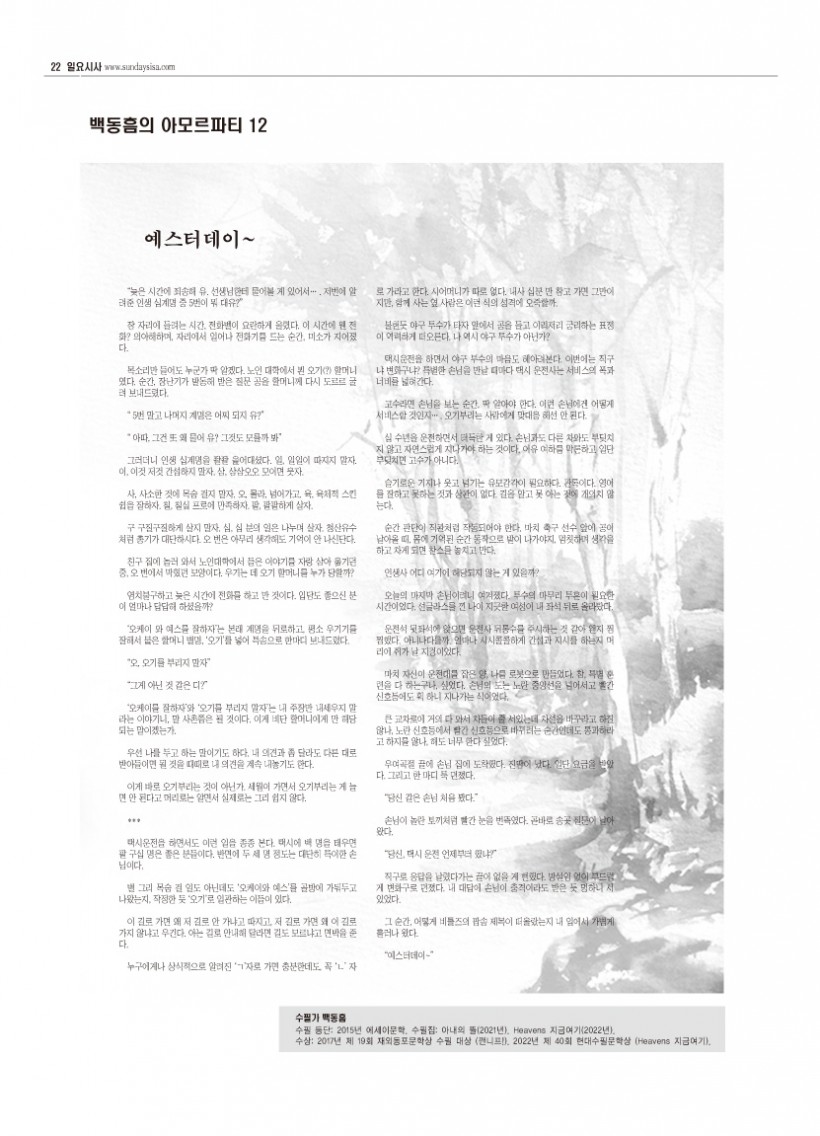백동흠의 아모르파티 12 ; 예스터데이~
“늦은 시간에 죄송해 유.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 저번에 알려준 인생 십계명 중 5번이 뭐 대유?”
잠 자리에 들려는 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 시간에 웬 전화? 의아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드는 순간, 미소가 지어졌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가 딱 알겠다. 노인 대학에서 뵌 오기(?) 할머니였다.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받은 질문 공을 할머니께 다시 도르르 굴려 보내드렸다.
“ 5번 말고 나머지 계명은 어찌 되지 유?”
“ 아따, 그건 또 왜 물어 유? 그것도 모를까 봐”
그러더니 인생 십계명을 좔좔 읊어대셨다. 일, 일일이 따지지 말자. 이, 이것 저것 간섭하지 말자. 삼, 삼삼오오 모이면 웃자.
사,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오, 몰라, 넘어가고. 육, 육체적 스킨 쉽을 잘하자. 칠, 칠십 프로에 만족하자. 팔, 팔팔하게 살자.
구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 십, 십 분의 일은 나누며 살자. 청산유수처럼 총기가 대단하시다. 오 번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신단다.
친구 집에 놀러 와서 노인대학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랑 삼아 옮기던 중, 오 번에서 막혔던 모양이다. 우기는 데 오기 할머니를 누가 당할까?
염치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고 만 것이다. 입담도 좋으신 분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오케이 와 예스를 잘하자’는 본래 계명을 뒤로하고, 평소 우기기를 잘해서 붙은 할머니 별명, ‘오기’를 넣어 특송으로 한마디 보내드렸다.
“오, 오기를 부리지 말자”
“그게 아닌 것 같은 디?”
‘오케이를 잘하자’와 ‘오기를 부리지 말자’는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니, 말 사촌쯤은 될 것이다. 이게 비단 할머니에게 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우선 나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내 의견과 좀 달라도 다른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때때로 내 의견을 계속 내놓기도 한다.
이게 바로 오기부리는 것이 아닌가. 세월이 가면서 오기부리는 게 늘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면서 실제로는 그리 쉽지 않다.
***
택시운전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종종 본다. 택시에 백 명을 태우면 팔 구십 명은 좋은 분들이다. 반면에 두 세 명 정도는 대단히 특이한 손님이다.
별 그리 목숨 걸 일도 아닌데도 ‘오케이와 예스’를 골방에 가둬두고 나왔는지, 작정한 듯 ‘오기’로 일관하는 이들이 있다.
이 길로 가면 왜 저 길로 안 가냐고 따지고, 저 길로 가면 왜 이 길로 가지 않냐고 우긴다. 아는 길로 안내해 달라면 길도 모르냐고 면박을 준다.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알려진 ‘ㄱ’자로 가면 충분한데도, 꼭 ‘ㄴ’ 자로 가라고 한다.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 내사 십분 만 참고 가면 그만이지만, 함께 사는 옆 사람은 이런 식의 성격에 오죽할까.
불현듯 야구 투수가 타자 앞에서 공을 들고 이리저리 궁리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떠오른다. 나 역시 야구 투수가 아닌가?
택시운전을 하면서 야구 투수의 마음도 헤아려본다. 이번에는 직구냐 변화구냐? 특별한 손님을 만날 때마다 택시 운전사는 서비스의 폭과 너비를 넓혀간다.
고수라면 손님을 보는 순간, 딱 알아야 한다. 이런 손님에겐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 . 오기부리는 사람에게 맞대응 해선 안 된다.
십 수년을 운전하면서 터득한 게 있다. 손님과도 다른 차와도 부딪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부딪치면 고수가 아니다.
슬기로운 기지나 웃고 넘기는 유모감각이 필요하다. 관록이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길을 알고 못 아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순간 판단이 직관처럼 작동되어야 한다. 마치 축구 선수 앞에 공이 날아올 때, 몸에 기억된 순간 동작으로 발이 나가야지, 멈칫하며 생각을 하고 차게 되면 찬스를 놓치고 만다.
인생사 어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려니 여겨졌다. 투수의 마무리 투혼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선글라스를 낀 나이 지긋한 여성이 내 좌석 뒤로 올라탔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으면 운전사 뒤통수를 주시하는 것 같아 왠지 찜찜했다. 아니나다를까. 얼마나 시시콜콜하게 간섭과 지시를 하는지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
마치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양, 나를 로봇으로 만들었다. 참, 특별 훈련을 다 하는구나, 싶었다. 손님의 도는 노란 중앙선을 넘어서고 빨간 신호등에도 휙 하니 지나가는 식이었다.
큰 교차로에 거의 다 와서 차들이 줄 서있는데 차선을 바꾸라고 하질 않나, 노란 신호등에서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인데도 통과하라고 하지를 않나, 해도 너무 한다 싶었다.
우여곡절 끝에 손님 집에 도착했다. 진땀이 났다. 일단 요금을 받았다. 그리고 한 마디 툭 던졌다.
“당신 같은 손님 처음 봤다.”
손님이 놀란 토끼처럼 빨간 눈을 번뜩였다. 곧바로 송곳 질문이 날아왔다.
“당신, 택시 운전 언제부터 했냐?”
직구로 응답을 날렸다가는 끝이 없을 게 뻔했다. 망설임 없이 부드럽게 변화구로 던졌다. 내 대답에 손님이 충격이라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어떻게 비틀즈의 팝송 제목이 떠올랐는지 내 입에서 가볍게 흘러나 왔다.
“예스터데이~”
----------------------------
수필가 백동흠
수필 등단: 2015년 에세이문학. 수필집: 아내의 뜰(2021년). Heavens 지금여기(2022년).
수상: 2017년 제 19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대상 (깬니프!). 2022년 제 40회 현대수필문학상 (Heavens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