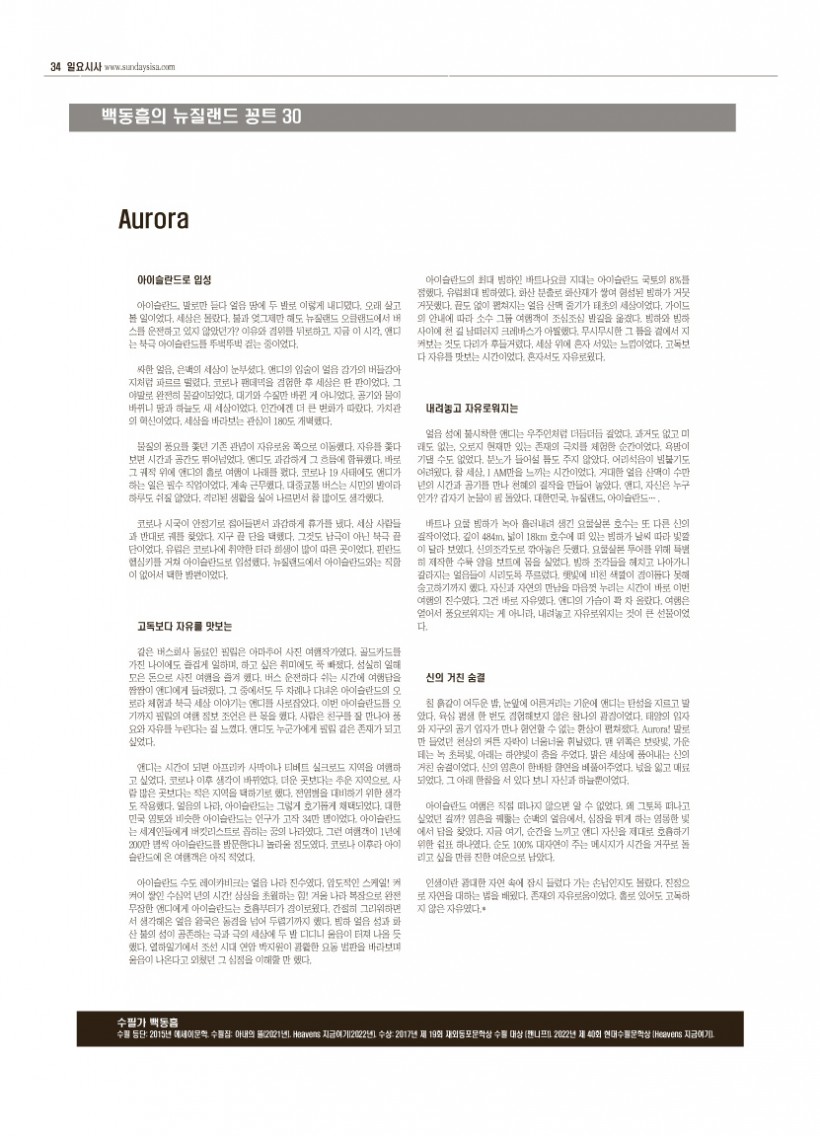백동흠의 뉴질랜드 꽁트 30 Aurora
아이슬란드로 입성
아이슬란드, 말로만 듣다 얼음 땅에 두 발로 이렇게 내디뎠다. 오래 살고 볼 일이었다. 세상은 몰랐다. 불과 엊그제만 해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지 않았던가? 이유와 경위를 뒤로하고. 지금 이 시각, 앤디는 북극 아이슬란드를 뚜벅뚜벅 걷는 중이었다.
싸한 얼음, 은백의 세상이 눈부셨다. 앤디의 입술이 얼음 강가의 버들강아지처럼 파르르 떨렸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후 세상은 딴 판이었다. 그야말로 완전히 물갈이되었다. 대기와 수질만 바뀐 게 아니었다. 공기와 물이 바뀌니 땅과 하늘도 새 세상이었다. 인간에겐 더 큰 변화가 따랐다. 가치관의 혁신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심이 180도 개벽했다.
물질의 풍요를 쫓던 기존 관념이 자유로움 쪽으로 이동했다. 자유를 쫓다 보면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었다. 앤디도 과감하게 그 흐름에 합류했다. 바로 그 궤적 위에 앤디의 홀로 여행이 나래를 폈다. 코로나 19 사태에도 앤디가 하는 일은 필수 직업이었다. 계속 근무했다. 대중교통 버스는 시민의 발이라 하루도 쉬질 않았다. 격리된 생활을 실어 나르면서 참 많이도 생각했다.
코로나 시국이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과감하게 휴가를 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궤를 찾았다. 지구 끝 단을 택했다. 그것도 남극이 아닌 북극 끝 단이었다. 유럽은 코로나에 취약한 터라 희생이 많이 따른 곳이었다. 핀란드 헬싱키를 거쳐 아이슬란드로 입성했다. 뉴질랜드에서 아이슬란드와는 직항이 없어서 택한 방편이었다.
고독보다 자유를 맛보는
같은 버스회사 동료인 필립은 아마추어 사진 여행작가였다. 골드카드를 가진 나이에도 즐겁게 일하며, 하고 싶은 취미에도 푹 빠졌다. 성실히 일해 모은 돈으로 사진 여행을 즐겨 했다. 버스 운전하다 쉬는 시간에 여행담을 짬짬이 앤디에게 들려줬다. 그 중에서도 두 차례나 다녀온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체험과 북극 세상 이야기는 앤디를 사로잡았다. 이번 아이슬란드를 오기까지 필립의 여행 정보 조언은 큰 몫을 했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풍요와 자유를 누린다는 걸 느꼈다. 앤디도 누군가에게 필립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앤디는 시간이 되면 아프리카 사막이나 티베트 실크로드 지역을 여행하고 싶었다. 코로나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더운 곳보다는 추운 지역으로, 사람 많은 곳보다는 적은 지역을 택하기로 했다.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생각도 작용했다.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는 그렇게 호기롭게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영토와 비슷한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고작 34만 명이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인들에게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꿈의 나라였다. 그런 여행객이 1년에 200만 명씩 아이슬란드를 방문한다니 놀라울 정도였다. 코로나 이후라 아이슬란드에 온 여행객은 아직 적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는 얼음 나라 진수였다. 압도적인 스케일! 켜켜이 쌓인 수십억 년의 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힘! 겨울 나라 복장으로 완전무장한 앤디에게 아이슬란드는 호흡부터가 경이로웠다.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생각해온 얼음 왕국은 동경을 넘어 두렵기까지 했다. 빙하 얼음 성과 화산 불의 성이 공존하는 극과 극의 세상에 두 발 디디니 울음이 터져 나올 듯했다. 열하일기에서 조선 시대 연암 박지원이 광활한 요동 벌판을 바라보며 울음이 나온다고 외쳤던 그 심정을 이해할 만 했다.
아이슬란드의 최대 빙하인 바트나요클 지대는 아이슬란드 국토의 8%를 점했다. 유럽최대 빙하였다. 화산 분출로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빙하가 거뭇거뭇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얼음 산맥 줄기가 태초의 세상이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소수 그룹 여행객이 조심조심 발길을 옮겼다. 빙하와 빙하 사이에 천 길 낭떠러지 크레바스가 아찔했다. 무시무시한 그 틈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세상 위에 혼자 서있는 느낌이었다. 고독보다 자유를 맛보는 시간이었다. 혼자서도 자유로웠다.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얼음 성에 불시착한 앤디는 우주인처럼 더듬더듬 걸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로지 현재만 있는 존재의 극치를 체험한 순간이었다. 욕망이 기댈 수도 없었다. 분노가 들어설 틈도 주지 않았다. 어리석음이 빌붙기도 어려웠다. 참 세상, I AM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거대한 얼음 산맥이 수만 년의 시간과 공기를 만나 천혜의 걸작을 만들어 놓았다. 앤디, 자신은 누구인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
바트나 요쿨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생긴 요쿨살론 호수는 또 다른 신의 걸작이었다. 깊이 484m, 넓이 18km 호수에 떠 있는 빙하가 날씨 따라 빛깔이 달라 보였다. 신의조각도로 깎아놓은 듯했다. 요쿨살론 투어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수륙 양용 보트에 몸을 실었다. 빙하 조각들을 헤치고 나아가니 갈라지는 얼음들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햇빛에 비친 색깔이 경이롭다 못해 숭고하기까지 했다. 자신과 자연의 만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번 여행의 진수였다. 그건 바로 자유였다. 앤디의 가슴이 꽉 차 올랐다. 여행은 얻어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큰 선물이었다.
신의 거친 숨결
칠 흙같이 어두운 밤, 눈앞에 어른거리는 기운에 앤디는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육십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찰나의 광경이었다. 태양의 입자와 지구의 공기 입자가 만나 형언할 수 없는 환상이 펼쳐졌다. Aurora! 말로만 들었던 천상의 커튼 자락이 너울너울 휘날렸다. 맨 위쪽은 보랏빛, 가운데는 녹 초록빛, 아래는 하얀빛이 춤을 추었다. 맑은 세상에 품어내는 신의 거친 숨결이었다. 신의 영혼이 한바탕 향연을 베풀어주었다. 넋을 잃고 매료되었다. 그 아래 한참을 서 있다 보니 자신과 하늘뿐이었다.
아이슬란드 여행은 직접 떠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왜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걸까? 영혼을 꿰뚫는 순백의 얼음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영롱한 빛에서 답을 찾았다. 지금 여기, 순간을 느끼고 앤디 자신을 제대로 호흡하기 위한 쉼표 하나였다. 순도 100% 대자연이 주는 메시지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을 만큼 진한 여운으로 남았다.
인생이란 광대한 자연 속에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인지도 몰랐다. 진정으로 자연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존재의 자유로움이었다. 홀로 있어도 고독하지 않은 자유였다.*
수필가 백동흠
수필 등단: 2015년 에세이문학. 수필집: 아내의 뜰(2021년). Heavens 지금여기(2022년). 수상: 2017년 제 19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대상 (깬니프!). 2022년 제 40회 현대수필문학상 (Heavens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