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손바닥 소설 2편; 손 매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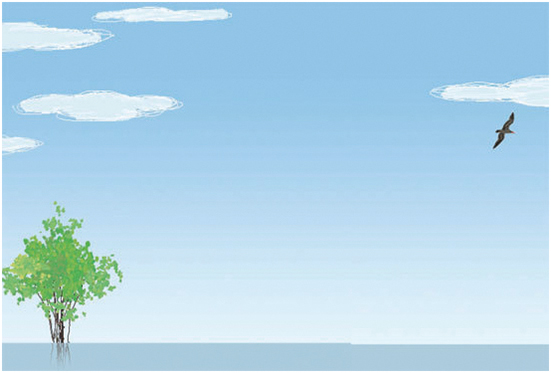
Paul이 샤워 실을 나오며 머리 물기를 턴다. 타월에 묻어 나오는 물기가 축축하다. 한 주일간, 토베이 경사진 곳에 있는 집수리 일을 마무리하느라 입에서 단내가 났다. 샤워하고 나니 낙지처럼 흐물거렸던 몸에 생기가 솟는다. 오래 숙성된 몬타나 레드와인을 우아한 컵에 한 잔 따른다. 안줏거리는 퇴근할 때 사온 테겔의 훈제 통닭이다. 홀로 갖는 조촐한 시간, 주말 저녁이면 이렇게 자신에게 한턱 쏜다. 예외 없이 스마트폰에서는 나나무스꾸리의 옛 노래, ‘사랑의 기쁨’이 흘러나온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둠이 내리는 창밖을 내려다보니 겨울비가 창 유리에 부딪힌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줄기가 빗금 쳐 내리고 있다. Paul의 눈자위가 더워지며 붉어진다. 대학 졸업반 때 아내와 데이트하며 즐겨 듣던 노래가 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나. 35년 전 일인데. 이런 생활이 벌써 몇 년짼가? 아내가 3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다. 출가해서 타우랑아에 살고 있는 외동 딸아이한테 다녀온 지도 6개월이 넘었다. Paul의 짧고도 굵은 뉴질랜드 이민 생활, 벌써 18년. 목울대를 타고 넘어가는 더운 맛….
***
퇴근하면서 임 집사 옷 수선 가계에서 찾아온 작업복 바지를 비닐봉투에서 꺼내 본다.
‘세상에나! 어찌 이리도 수선 솜씨가 좋나, 탄탄하게 덧대서 잘도 기웠구먼!’
무르팍과 엉덩이 부분이 너덜너덜 해지고 닳았던 바지. 대충 실로 얼기설기 꿰매서 그런대로 입다가 어제 맡겼던 바지가 대변신을 했다. 눈에 띄게 야무진 임 집사의 수선 실력과 정성에 묘한 공감이 일었다. 한 달 전, Paul이 임 집사의 낡은 집을 수리했던 것과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는 Paul이 실력 발휘해서 임 집사 집의 낡은 것을 완전 새롭게 바꿔놓지 않았던가. 일하기 전,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으니까. 싱크대 아래로 오랫동안 물이 새서 바닥이 부풀어 올랐고, 마룻바닥도 썩은 상태였다. 임 집사가 Paul의 누덕 바지를 덧대고 재봉질했던 것처럼, Paul도 임집사 집의 썩어 낡아진 싱크대 주위를 번쩍거리게 바꿔놓았다.
손 매무새가 서로 닮은 꼴인가? 수선집 아줌마, 임 집사가 달리 보인다. 아내 장례식 때 유난히도 눈물을 흘렸던 사람, 인간적인 동병상련 때문이었을까? 한쪽 날개가 부러진 채로 잘 날지 못하는 새와 다를 바 없다. 임 집사의 남편은 중풍으로 왼쪽 하반신을 잘 못 쓰고 있다. Paul은 완전히 한 쪽 날개가 떨어져 나간 경우고, 임 집사는 한쪽 날개가 크게 상한 입장이다. 부모 형제 친척도 없는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부러진 날개를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한다.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제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운명이려니 하고 살기에는 억울한 느낌마저 든다. 왜 아픈 사람 눈에는 유독 힘든 사람만 보일까? 약한 자에게 향하는 연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바쁠 때, 가끔 조수로 거들어주는 John의 얄궂은 장난기 말이 귀에 뱅뱅 돈다.
“행님요! 그 낡은 바지 버리고 새로 하나 퍼뜩 사요. 밑천이 다 보이겠어요. 한 $20만 줘도 아주 실하고 좋아유”
“야, 이놈아! 또 그 얘기냐? 내 돈이 없어 못산 게 아녀. 넌 내 마음 알려면 멀었어.”
Paul은 터져 나오려는 속 내는 꿀꺽 삼켰다. 그 작업복 바지에 애착이 간 건, 돌아간 아내의 손자국이 배어서였다. 알뜰살뜰하기로 소문난 아내는 Paul의 머리를 직접 깎아줄 정도로 솜씨가 좋았다. 한국에서 이민 올 때 가져온 부라더 미싱으로 해지고 낡은 옷도 잘 수선해 주었다. 뉴질랜드 삶이야 남자나 여자나 손재주가 좋으면 남의 손 빌리지 않고 꾸려나갈 수 있어 그만이다. 뉴질랜드 현지인, Kiwi들은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 아내랑 Warehouse에서 쇼핑한 적이 있었다. 그 작업복 바지가 Paul 눈에 띄어 관심을 보이자 아내가 선물이라며 얼른 돈을 내고 샀다.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이어서 마음이 더 갔다. 아직도 온기가 살아있는 아내의 유품 같았다. Paul이 편해서 즐겨 입다 보니 낡아졌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천을 덧대고 재봉틀로 누볐다.
그 옷을 입으면 왠지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편안했다.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에 나갈 때 유독 좋아하는 속옷을 골라 입는 경우처럼 그랬다. 좋은 징크스라 생각했다. 약간은 벙한 John이 그런 깊은 속내를 어찌 알까. 하여튼 다 낡고 해진 작업복이 솜씨 좋은 임 집사 손을 통해 다시 복원됐다. Paul에게 다시 살아갈 에너지가 재충전됐다. 받았으면 뭐라도 주어야 할 텐데, 어떻게 답례를 할까? Paul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임 집사 집수리를 하며 마음 한쪽에 걸렸던 게 퍼뜩 떠올랐다. 그날, Paul이 오전 작업을 끝내고 출출해서 집 뒤 데크로 나갔다. 도시락으로 싸 온 샌드위치를 꺼내 먹으려는 순간이었다. 오른쪽 데크 끝에 임 집사 남편이 지팡이를 집고 경사진 뒤뜰로 내려가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눈을 들어보니 마루 데크 아래 우유 담는 박스가 엎어져 있고 그 아래에 보도블록이 놓여있었다. 계단이 없다 보니 임시로 그렇게 쓰는 모양이었다. Paul이 대충 점심을 먹고 나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임 집사 남편이 끙끙대며 보도블록과 우유 박스를 딛고 데크로 올라오는 게 보였다. 손에는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가 들려있었다. 그 포도를 Paul에게 건네주며 후식 입가심으로 들라고 했다. Paul이 엉겁결에 받아 들었다. 몸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한 임 집사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고개가 숙어졌다. 경사진 아래 뒤뜰 펜스에 포도나무가 있었던 모양이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얼마나 부자인가. 그런 나눔을 받는 입장이니 덩달아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Paul이 담배에 불을 붙였던 것도 사실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서였다. 얼마 전, 남 사장네 집 데크를 닷새 걸려 놓아주었는데, 추가 작업비용, $500을 주지 않는 거였다. 독촉 전화를 했더니 남 사장이 버럭 화를 냈다. 공사에 트집을 잡고 추가 비용은 못 주겠다고 배 째라는 통보였다. 공사를 날림으로 했다느니, 재료가 싸구려라느니, 다른 사람은 더 싸게 해줬다는 등등… . 그 큰 공사하고 나서 오른쪽 팔에 큰 곰 한 마리가 앉아서 떨어지지 않았다. $500이면 John이 닷새 거들어줘서 준 임금이었다. 그런 돈을 꿀꺽하겠다니 기도 안 찼던 터였다. 임 집사 남편의 포도 한 송이를 받아 들고 한 알씩 먹다 보니 희한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곰의 몸무게가 차츰 줄어들었다.
Paul이 포도 한 송이를 다 먹고서 임 집사 남편이 힘들게 오르내렸던 임시 계단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마크 줄자를 꺼내 위아래 옆으로 가늠해봤다. 수첩에 쓱쓱 스케치했다. 계단 모양의 그림이 나왔다. 길이와 높이 그리고 너비를 적어 넣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3단짜리 나무 계단을 만들어 데크 아래 붙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
그동안, 수주 들어온 일들로 바빠 까마득히 잊어버렸었는데 임 집사 옷 수선을 보면서 다시 떠올랐다. Paul이 작업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그 메모 수첩을 꺼냈다. 길이 1m, 높이 70cm, 너비 20cm로 기록되어있었다. 3단 발판이면 임 집사 남편이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이라 해도 뭉클한 일을 대하고 나면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다. 가진 게 많아서 서로 나누는 게 아니다.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실린 정성은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 개라지로 내려가 불을 켜고 한쪽에 쌓아둔 팀버 조각들을 살펴본다. 어림잡아도 임집사 집 뒤 데크에 댈 3단 계단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내일 주일, 오전에 교회 다녀와서 뚝딱거리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 저녁 해지기 전에 만든 계단을 차에 싣고 가서 설치해주면 한 주일의 마무리는 더할 나위 없이 은혜로울 것 같다.
거실로 올라와 몬타나 레드 와인병을 기울여 한잔 더 따라 마신다. 의례 나오는 음악. 스마트폰에서 나나무스꾸리의 ‘사랑의 기쁨’의 뒷부분이 흘러나온다.
‘초원을 흐르는 저 시냇물을 향해 / 이 물이 끝없이 흐르는 한 / 당신을 사랑하리~’ *
# Lynn : 소설가. 오클랜드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