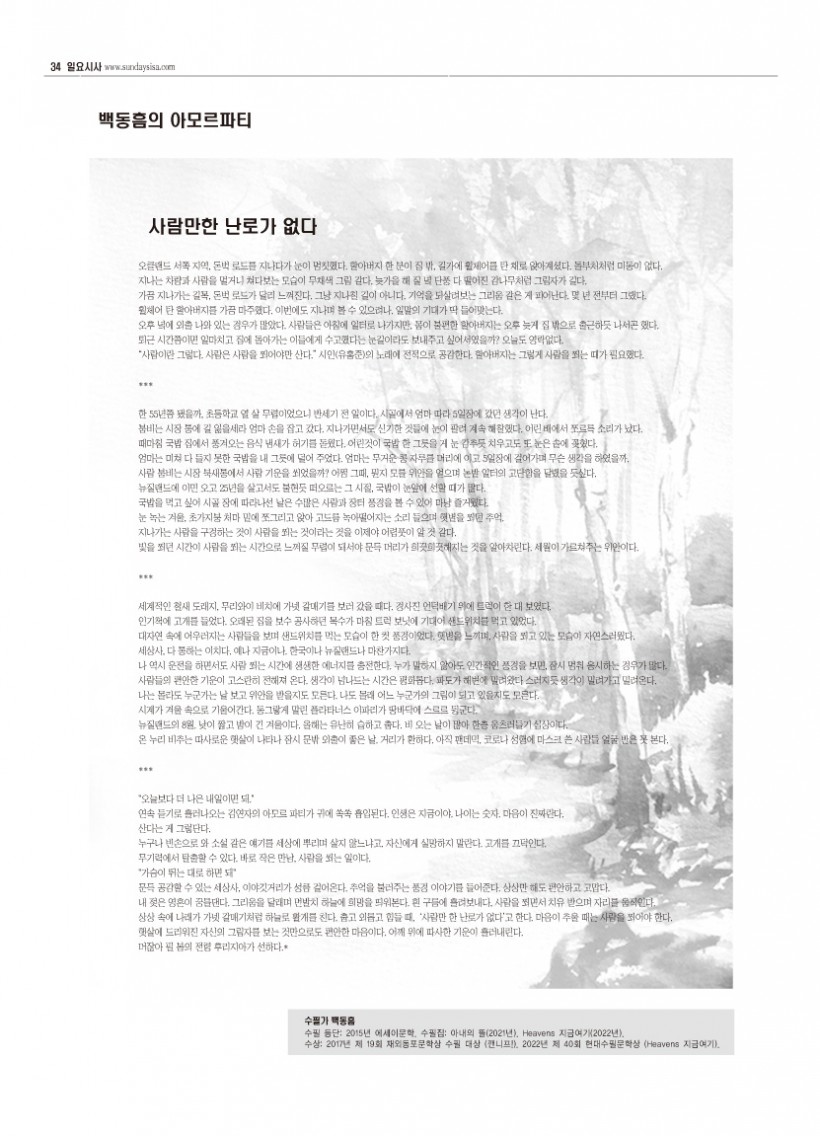백동흠의 아모르파티; 사람만한 난로가 없다
오클랜드 서쪽 지역, 돈벅 로드를 지나다가 눈이 멈칫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집 밖, 길가에 휠체어를 탄 채로 앉아계셨다. 돌부처처럼 미동이 없다.
지나는 차량과 사람을 멀거니 쳐다보는 모습이 무채색 그림 같다. 늦가을 해 질 녘 단풍 다 떨어진 감나무처럼 그림자가 길다.
가끔 지나가는 길목, 돈벅 로드가 달리 느껴진다. 그냥 지나칠 길이 아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는 그리움 같은 게 피어난다. 몇 년 전부터 그랬다.
휠체어 탄 할아버지를 가끔 마주했다. 이번에도 지나며 볼 수 있으려나. 일말의 기대가 딱 들어맞는다.
오후 녘에 외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터로 나가지만,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오후 늦게 집 밖으로 출근하듯 나서곤 했다.
퇴근 시간쯤이면 일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이들에게 수고했다는 눈길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서였을까? 오늘도 영락없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만 산다.” 시인(유홍준)의 노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을 쬐는 때가 필요했다.
***
한 55년쯤 됐을까, 초등학교 열 살 무렵이었으니 반세기 전 일이다. 시골에서 엄마 따라 5일장에 갔던 생각이 난다.
붐비는 시장 통에 길 잃을세라 엄마 손을 잡고 갔다. 지나가면서도 신기한 것들에 눈이 팔려 계속 해찰했다. 어린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다.
때마침 국밥 집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가 허기를 돋웠다. 어린것이 국밥 한 그릇을 게 눈 감추듯 치우고도 또 눈은 솥에 꽂혔다.
엄마는 미쳐 다 들지 못한 국밥을 내 그릇에 덜어 주었다. 엄마는 무거운 콩 자루를 머리에 이고 5일장에 걸어가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사람 붐비는 시장 북새통에서 사람 기운을 쐬었을까? 어쩜 그때, 뭔지 모를 위안을 얻으며 논밭 일터의 고단함을 달랬을 듯싶다.
뉴질랜드에 이민 오고 25년을 살고서도 불현듯 떠오르는 그 시절, 국밥이 눈앞에 선할 때가 많다.
국밥을 먹고 싶어 시골 장에 따라나선 날은 수많은 사람과 장터 풍경을 볼 수 있어 마냥 즐거웠다.
눈 녹는 겨울, 초가지붕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고드름 녹아떨어지는 소리 들으며 햇볕을 쬐던 추억.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사람을 쬐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빛을 쬐던 시간이 사람을 쬐는 시간으로 느껴질 무렵이 돼서야 문득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세월이 가르쳐주는 위안이다.
***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무리와이 비치에 가넷 갈매기를 보러 갔을 때다. 경사진 언덕배기 위에 트럭이 한 대 보였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오래된 집을 보수 공사하던 목수가 마침 트럭 보닛에 기대어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대자연 속에 어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한 컷 풍경이었다. 햇볕을 느끼며, 사람을 쬐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세상사, 다 통하는 이치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마찬가지다.
나 역시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 쬐는 시간에 생생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풍경을 보면, 잠시 멈춰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편안한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생각이 넘나드는 시간은 평화롭다.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 스러지듯 생각이 밀려가고 밀려온다.
나는 몰라도 누군가는 날 보고 위안을 받을지도 모른다. 나도 몰래 어느 누군가의 그림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계가 겨울 속으로 기울어간다. 동그랗게 말린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땅바닥에 스르르 뒹군다.
뉴질랜드의 8월. 낮이 짧고 밤이 긴 겨울이다. 올해는 유난히 습하고 춥다. 비 오는 날이 많아 한층 움츠러들기 십상이다.
온 누리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이 나타나 잠시 문밖 외출이 좋은 날. 거리가 환하다. 아직 팬데믹, 코로나 성행에 마스크 쓴 사람들 얼굴 반은 못 본다.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연속 듣기로 흘러나오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귀에 쏙쏙 흡입된다. 인생은 지금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란다.
산다는 게 그렇단다.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얘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란다. 고개를 끄덕인다.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 바로 작은 만남, 사람을 쐬는 일이다.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문득 공감할 수 있는 세상사, 이야깃거리가 성큼 걸어온다. 추억을 불러주는 풍경 이야기를 들어준다. 상상만 해도 편안하고 고맙다.
내 젖은 영혼이 꿈틀댄다. 그리움을 달래며 먼발치 하늘에 희망을 띄워본다. 흰 구름에 흘려보내다, 사람을 쬐면서 치유 받으며 자리를 움직인다.
상상 속에 나래가 가넷 갈매기처럼 하늘로 활개를 친다. 춥고 외롭고 힘들 때, ‘사람만 한 난로가 없다’고 한다. 마음이 추울 때는 사람을 쬐어야 한다.
햇살에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이다. 어깨 위에 따사한 기운이 흘러내린다.
머잖아 필 봄의 전령 후리지아가 선하다.*
오클랜드 서쪽 지역, 돈벅 로드를 지나다가 눈이 멈칫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집 밖, 길가에 휠체어를 탄 채로 앉아계셨다. 돌부처처럼 미동이 없다.
지나는 차량과 사람을 멀거니 쳐다보는 모습이 무채색 그림 같다. 늦가을 해 질 녘 단풍 다 떨어진 감나무처럼 그림자가 길다.
가끔 지나가는 길목, 돈벅 로드가 달리 느껴진다. 그냥 지나칠 길이 아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는 그리움 같은 게 피어난다. 몇 년 전부터 그랬다.
휠체어 탄 할아버지를 가끔 마주했다. 이번에도 지나며 볼 수 있으려나. 일말의 기대가 딱 들어맞는다.
오후 녘에 외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터로 나가지만,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오후 늦게 집 밖으로 출근하듯 나서곤 했다.
퇴근 시간쯤이면 일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이들에게 수고했다는 눈길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서였을까? 오늘도 영락없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만 산다.” 시인(유홍준)의 노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을 쬐는 때가 필요했다.
***
한 55년쯤 됐을까, 초등학교 열 살 무렵이었으니 반세기 전 일이다. 시골에서 엄마 따라 5일장에 갔던 생각이 난다.
붐비는 시장 통에 길 잃을세라 엄마 손을 잡고 갔다. 지나가면서도 신기한 것들에 눈이 팔려 계속 해찰했다. 어린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다.
때마침 국밥 집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가 허기를 돋웠다. 어린것이 국밥 한 그릇을 게 눈 감추듯 치우고도 또 눈은 솥에 꽂혔다.
엄마는 미쳐 다 들지 못한 국밥을 내 그릇에 덜어 주었다. 엄마는 무거운 콩 자루를 머리에 이고 5일장에 걸어가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사람 붐비는 시장 북새통에서 사람 기운을 쐬었을까? 어쩜 그때, 뭔지 모를 위안을 얻으며 논밭 일터의 고단함을 달랬을 듯싶다.
뉴질랜드에 이민 오고 25년을 살고서도 불현듯 떠오르는 그 시절, 국밥이 눈앞에 선할 때가 많다.
국밥을 먹고 싶어 시골 장에 따라나선 날은 수많은 사람과 장터 풍경을 볼 수 있어 마냥 즐거웠다.
눈 녹는 겨울, 초가지붕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고드름 녹아떨어지는 소리 들으며 햇볕을 쬐던 추억.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사람을 쬐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빛을 쬐던 시간이 사람을 쬐는 시간으로 느껴질 무렵이 돼서야 문득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세월이 가르쳐주는 위안이다.
***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무리와이 비치에 가넷 갈매기를 보러 갔을 때다. 경사진 언덕배기 위에 트럭이 한 대 보였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오래된 집을 보수 공사하던 목수가 마침 트럭 보닛에 기대어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대자연 속에 어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한 컷 풍경이었다. 햇볕을 느끼며, 사람을 쬐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세상사, 다 통하는 이치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마찬가지다.
나 역시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 쬐는 시간에 생생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풍경을 보면, 잠시 멈춰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편안한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생각이 넘나드는 시간은 평화롭다.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 스러지듯 생각이 밀려가고 밀려온다.
나는 몰라도 누군가는 날 보고 위안을 받을지도 모른다. 나도 몰래 어느 누군가의 그림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계가 겨울 속으로 기울어간다. 동그랗게 말린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땅바닥에 스르르 뒹군다.
뉴질랜드의 8월. 낮이 짧고 밤이 긴 겨울이다. 올해는 유난히 습하고 춥다. 비 오는 날이 많아 한층 움츠러들기 십상이다.
온 누리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이 나타나 잠시 문밖 외출이 좋은 날. 거리가 환하다. 아직 팬데믹, 코로나 성행에 마스크 쓴 사람들 얼굴 반은 못 본다.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연속 듣기로 흘러나오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귀에 쏙쏙 흡입된다. 인생은 지금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란다.
산다는 게 그렇단다.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얘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란다. 고개를 끄덕인다.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 바로 작은 만남, 사람을 쐬는 일이다.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문득 공감할 수 있는 세상사, 이야깃거리가 성큼 걸어온다. 추억을 불러주는 풍경 이야기를 들어준다. 상상만 해도 편안하고 고맙다.
내 젖은 영혼이 꿈틀댄다. 그리움을 달래며 먼발치 하늘에 희망을 띄워본다. 흰 구름에 흘려보내다, 사람을 쬐면서 치유 받으며 자리를 움직인다.
상상 속에 나래가 가넷 갈매기처럼 하늘로 활개를 친다. 춥고 외롭고 힘들 때, ‘사람만 한 난로가 없다’고 한다. 마음이 추울 때는 사람을 쬐어야 한다.
햇살에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이다. 어깨 위에 따사한 기운이 흘러내린다.
머잖아 필 봄의 전령 후리지아가 선하다.*
오클랜드 서쪽 지역, 돈벅 로드를 지나다가 눈이 멈칫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집 밖, 길가에 휠체어를 탄 채로 앉아계셨다. 돌부처처럼 미동이 없다.
지나는 차량과 사람을 멀거니 쳐다보는 모습이 무채색 그림 같다. 늦가을 해 질 녘 단풍 다 떨어진 감나무처럼 그림자가 길다.
가끔 지나가는 길목, 돈벅 로드가 달리 느껴진다. 그냥 지나칠 길이 아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는 그리움 같은 게 피어난다. 몇 년 전부터 그랬다.
휠체어 탄 할아버지를 가끔 마주했다. 이번에도 지나며 볼 수 있으려나. 일말의 기대가 딱 들어맞는다.
오후 녘에 외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터로 나가지만,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오후 늦게 집 밖으로 출근하듯 나서곤 했다.
퇴근 시간쯤이면 일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이들에게 수고했다는 눈길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서였을까? 오늘도 영락없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만 산다.” 시인(유홍준)의 노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을 쬐는 때가 필요했다.
***
한 55년쯤 됐을까, 초등학교 열 살 무렵이었으니 반세기 전 일이다. 시골에서 엄마 따라 5일장에 갔던 생각이 난다.
붐비는 시장 통에 길 잃을세라 엄마 손을 잡고 갔다. 지나가면서도 신기한 것들에 눈이 팔려 계속 해찰했다. 어린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다.
때마침 국밥 집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가 허기를 돋웠다. 어린것이 국밥 한 그릇을 게 눈 감추듯 치우고도 또 눈은 솥에 꽂혔다.
엄마는 미쳐 다 들지 못한 국밥을 내 그릇에 덜어 주었다. 엄마는 무거운 콩 자루를 머리에 이고 5일장에 걸어가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사람 붐비는 시장 북새통에서 사람 기운을 쐬었을까? 어쩜 그때, 뭔지 모를 위안을 얻으며 논밭 일터의 고단함을 달랬을 듯싶다.
뉴질랜드에 이민 오고 25년을 살고서도 불현듯 떠오르는 그 시절, 국밥이 눈앞에 선할 때가 많다.
국밥을 먹고 싶어 시골 장에 따라나선 날은 수많은 사람과 장터 풍경을 볼 수 있어 마냥 즐거웠다.
눈 녹는 겨울, 초가지붕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고드름 녹아떨어지는 소리 들으며 햇볕을 쬐던 추억.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사람을 쬐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빛을 쬐던 시간이 사람을 쬐는 시간으로 느껴질 무렵이 돼서야 문득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세월이 가르쳐주는 위안이다.
***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무리와이 비치에 가넷 갈매기를 보러 갔을 때다. 경사진 언덕배기 위에 트럭이 한 대 보였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오래된 집을 보수 공사하던 목수가 마침 트럭 보닛에 기대어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대자연 속에 어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한 컷 풍경이었다. 햇볕을 느끼며, 사람을 쬐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세상사, 다 통하는 이치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마찬가지다.
나 역시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 쬐는 시간에 생생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풍경을 보면, 잠시 멈춰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편안한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생각이 넘나드는 시간은 평화롭다.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 스러지듯 생각이 밀려가고 밀려온다.
나는 몰라도 누군가는 날 보고 위안을 받을지도 모른다. 나도 몰래 어느 누군가의 그림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계가 겨울 속으로 기울어간다. 동그랗게 말린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땅바닥에 스르르 뒹군다.
뉴질랜드의 8월. 낮이 짧고 밤이 긴 겨울이다. 올해는 유난히 습하고 춥다. 비 오는 날이 많아 한층 움츠러들기 십상이다.
온 누리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이 나타나 잠시 문밖 외출이 좋은 날. 거리가 환하다. 아직 팬데믹, 코로나 성행에 마스크 쓴 사람들 얼굴 반은 못 본다.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연속 듣기로 흘러나오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귀에 쏙쏙 흡입된다. 인생은 지금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란다.
산다는 게 그렇단다.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얘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란다. 고개를 끄덕인다.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 바로 작은 만남, 사람을 쐬는 일이다.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문득 공감할 수 있는 세상사, 이야깃거리가 성큼 걸어온다. 추억을 불러주는 풍경 이야기를 들어준다. 상상만 해도 편안하고 고맙다.
내 젖은 영혼이 꿈틀댄다. 그리움을 달래며 먼발치 하늘에 희망을 띄워본다. 흰 구름에 흘려보내다, 사람을 쬐면서 치유 받으며 자리를 움직인다.
상상 속에 나래가 가넷 갈매기처럼 하늘로 활개를 친다. 춥고 외롭고 힘들 때, ‘사람만 한 난로가 없다’고 한다. 마음이 추울 때는 사람을 쬐어야 한다.
햇살에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이다. 어깨 위에 따사한 기운이 흘러내린다.
머잖아 필 봄의 전령 후리지아가 선하다.*
---------------------------------------------------------------------------------------------------------
수필가 백동흠
수필 등단: 2015년 에세이문학. 수필집: 아내의 뜰(2021년). Heavens 지금여기(2022년).
수상: 2017년 제 19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대상 (깬니프!). 2022년 제 40회 현대수필문학상 (Heavens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