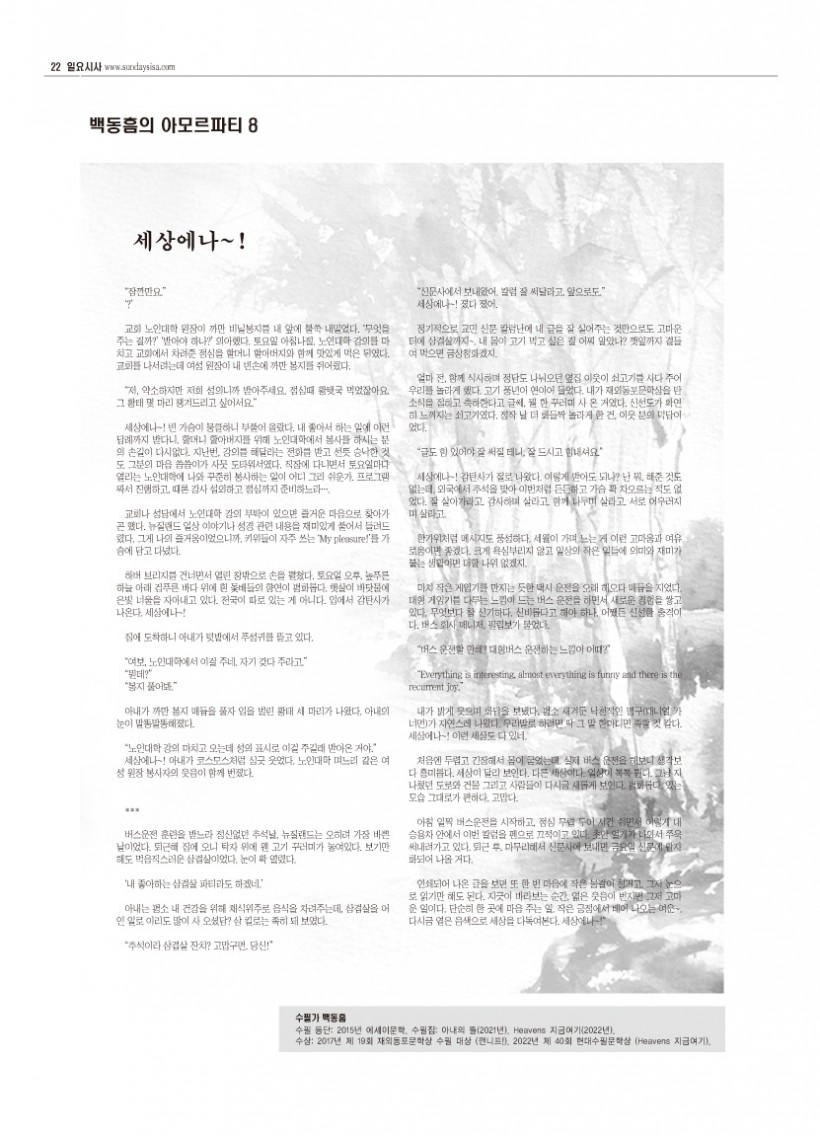백동흠의 아모르파티 8 ; 세상에나~!
“잠깐만요.”
‘?’
교회 노인대학 원장이 까만 비닐봉지를 내 앞에 불쑥 내밀었다. ‘무엇을 주는 걸까?’ ‘받아야 하나?’ 의아했다. 토요일 아침나절. 노인대학 강의를 마치고 교회에서 차려준 점심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맛있게 먹은 뒤였다. 교회를 나서려는데 여성 원장이 내 빈손에 까만 봉지를 쥐어줬다.
“저, 약소하지만 저희 성의니까 받아주세요. 점심때 황탯국 먹었잖아요. 그 황태 몇 마리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세상에나~! 빈 가슴이 뭉클하니 부풀어 올랐다. 내 좋아서 하는 일에 이런 답례까지 받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노인대학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의 손길이 다시없다. 지난번, 강의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뜻 승낙한 것도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사뭇 도타워서였다. 직장에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노인대학에 나와 꾸준히 봉사하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가. 프로그램 짜서 진행하고, 때론 강사 섭외하고 점심까지 준비하느라….
교회나 성당에서 노인대학 강의 부탁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곤 했다. 뉴질랜드 일상 이야기나 성경 관련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들려드렸다. 그게 나의 즐거움이었으니까. 키위들이 자주 쓰는 ‘My pleasure!’를 가슴에 담고 다녔다.
하버 브리지를 건너면서 열린 창밖으로 손을 펼쳤다. 토요일 오후, 높푸른 하늘 아래 검푸른 바다 위에 흰 돛배들의 향연이 평화롭다. 햇살이 바닷물에 은빛 너울을 자아내고 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입에서 감탄사가 나온다. 세상에나~!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텃밭에서 푸성귀를 뜯고 있다.
“여보, 노인대학에서 이걸 주네. 자기 갖다 주라고.”
“뭔데?”
“봉지 풀어봐.”
아내가 까만 봉지 매듭을 풀자 입을 벌린 황태 세 마리가 나왔다. 아내의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노인대학 강의 마치고 오는데 성의 표시로 이걸 주길래 받아온 거야.”
세상에나~! 아내가 코스모스처럼 싱긋 웃었다. 노인대학 며느리 같은 여성 원장 봉사자의 웃음이 함께 번졌다.
***
버스운전 훈련을 받느라 정신없던 추석날, 뉴질랜드는 오히려 가장 바쁜 날이었다. 퇴근해 집에 오니 탁자 위에 웬 고기 꾸러미가 놓여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삼겹살이었다. 눈이 확 열렸다.
‘내 좋아하는 삼겹살 파티라도 하겠네.’
아내는 평소 내 건강을 위해 채식위주로 음식을 차려주는데, 삼겹살을 어인 일로 이리도 많이 사 오셨담? 삼 킬로는 족히 돼 보였다.
“추석이라 삼겹살 잔치? 고맙구먼. 당신!”
“신문사에서 보내왔어. 칼럼 잘 써달라고. 앞으로도.”
세상에나~! 졌다 졌어.
정기적으로 교민 신문 칼럼난에 내 글을 잘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터에 삼겹살까지~. 내 몸이 고기 먹고 싶은 걸 어찌 알았나? 깻잎까지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겠지.
얼마 전, 함께 식사하며 정담도 나눠오던 옆집 이웃이 쇠고기를 사다 주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고기 풍년이 연이어 들었다. 내가 재외동포문학상을 탄 소식을 접하고 축하한다고 글쎄, 뭘 한 꾸러미 사 온 거였다. 신선도가 확연히 느껴지는 쇠고기였다. 정작 날 더 화들짝 놀라게 한 건, 이웃 분의 덕담이었다.
“글도 힘 있어야 잘 써질 테니, 잘 드시고 힘내셔요.”
세상에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외국에서 추석을 맞아 이번처럼 든든하고 가슴 꽉 차오르는 적도 없었다. 잘 살아가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함께 나누며 살라고. 서로 어우러지며 살라고.
한가위처럼 메시지도 풍성하다. 세월이 가며 느는 게 이런 고마움과 여유로움이면 좋겠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 의미와 재미가 붙는 생활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
마치 작은 게임기를 만지는 듯한 택시 운전을 오래 해오다 매듭을 지었다. 대형 게임기를 다루는 느낌이 드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다. 무엇보다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신선한 충격이다. 버스 회사 매니저, 필립보가 물었다.
“버스 운전할 만해? 대형버스 운전하는 느낌이 어때?”
“Everything is interesting, almost everything is funny and there is the recurrent joy.”
내가 밝게 웃으며 화답을 보냈다. 평소 새겨둔 낙천적인 명구(대니얼 카너먼)가 자연스레 나왔다. 우리말로 하려면 딱 그 말 한마디면 족할 것 같다. 세상에나~! 이런 세상도 다 있네.
처음엔 두렵고 긴장해서 몸이 굳었는데. 실제 버스 운전을 해보니 생각보다 흥미롭다. 세상이 달리 보인다. 다른 세상이다. 일상이 톡톡 튄다. 그냥 지나쳤던 도로와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금 새롭게 보인다. 평화롭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편하다. 고맙다.
아침 일찍 버스운전을 시작하고, 점심 무렵 두어 시간 쉬면서 이렇게 내 승용차 안에서 이번 칼럼을 펜으로 끄적이고 있다. 초안 얼개가 나와서 쭈욱 써내려가고 있다. 퇴근 후, 마무리해서 신문사에 보내면 금요일 신문에 활자화되어 나올 거다.
인쇄되어 나온 글을 보면 또 한 번 마음에 작은 물결이 칠거고. 그저 눈으로 읽기만 해도 된다. 지긋이 바라보는 순간, 엷은 웃음이 번지면 그저 고마운 일이다. 단순히 한 곳에 마음 주는 일. 작은 긍정에서 배어 나오는 여운~. 다시금 옅은 음색으로 세상을 다독여본다. 세상에나~!"